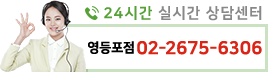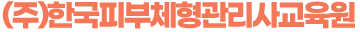빠친코게임 ≤ 30.rgk574.top ≤ 바둑이라이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민수호 작성일25-05-18 07:0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48.rnt829.top
0회 연결
http://48.rnt829.top
0회 연결
-
 http://38.rzp469.top
0회 연결
http://38.rzp469.top
0회 연결
본문
【50.rgk574.top】
황금성 게임 다운로드동영상황금성모바일파칭코최신릴게임
K.W. Lee(한국명 이경원, 1928.6.1~ 2025.3.8)는 미국 저널리즘 교육 100주년을 기념해 2012년 뉴욕대 아서 L. 카터 저널리즘연구 있 소가 선정한 ‘지난 100년 가장 뛰어난 미국 언론인 100인’에 포함된 유일한 한국계 저널리스트다. 연구소는 그를 “1979년 한국계 최초 영자매체인 ‘Koreatown Weekly’를 창간한 기자 겸 칼럼니스트”라 간략하게 소개했다. 언론인 겸 작가 에릭 뉴턴(Eric Mewton)은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근년까지 미국 저널리즘 역사에 영광과 수치의 족 혜택 적을 남긴 300인을 다룬 책 ‘Crusaders, Scoundrels, Journalists(2000)’에 K.W. 리를,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의 흑인 인권운동가 W.E.B 두보이스(DuBois), 여성 서프라제트 활동가 앨리스 스톤 블랙웰(Alice Stone Blackwell), 초창기 AIDS 보도로 이름을 날린 미국 최초 공개 동성애자 온누리상품권 기자 랜디 쉴츠(Landy Shilis) 등과 나란히 ‘차별 장벽을 허문 언론인’으로 소개했다.K.W. 리의 ‘Koreatown Weekly’ 이전까지 한국계 미국인은 차별과 불의, 소수자의 삶과 존엄을 저널리즘의 언어로 말할 수 없었고, 오직 주류 언론의 관심과 선의에 의지해야 했다. 그에겐 좌파-우파 언론 분류는 한가한 ‘헛소리’일 뿐이었다. “나는 든든학자금대출금리 언론을 새의 관점(bird's eyd)과 애벌레의 관점으로 나눈다. 내가 고수해온 저널리즘은 애벌레 관점(worm’s-eye view)의 저널리즘이다.”기사로 약자-소수자의 정의와 진실을 알리고, 한국계-일본계를 비롯한 아시안 공동체의 결속과 아프리카계 미국인과의 화합에 기여한 언론인 K.W. 리(이하 이경원)가 별세했다. 향년 96세.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소서 이경원은 70년대의 한 사건, 즉 사형수 ‘Chol Su Lee(이하 이철수, 1952~2014)’의 결백을 무려 5년여간 집요하게 보도함으로써 그의 재심-석방을 이끌어낸 저널리스트로 더러 기억된다. 이철수는 1973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 범죄조직 간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기형을 선고 받았고, 수감 중이던 77년 백인 우월주의 단체 조직원을 다툼 끝에 살해해 사형수가 됐다.‘새크라멘토 유니언(The Sacramento Union)’지 기자 이경원은 77년 이철수 사건 취재를 시작해 수사-기소-재판 과정의 부실과 의혹 등을 사실상 처음, 유일하게 집중 보도했다. 그의 보도 덕에 이철수 구명운동이 확산됐고, 이철수는 82년 재심을 받고 이듬해 석방됐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철수 사건'을 한 개인의 구명을 넘어 “미국 거주 한인 동포들을 하나로 단결”하게 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재심 재판을 통해 1983년 석방된 이철수(오른쪽)와 나란히 앉은 이경원. 그는 이철수 사건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았고 이철수가 겪은 삶의 굴곡과 비극이야말로 미국 사회 시스템의 실패의 결과라 여겼다. K.W. Lee Center for Leadership
이경원이 5년이나 지난 이철수 사건 취재를 시작한 건 일본계 미국인 로스쿨 학생 야마다 랜코(Yamada Ranko)의 ‘이철수 구명운동’ 때문이었다. “동포들조차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무명의 한국계 비행 청년을 위해 일본계 미국인 여자아이가 왜 저렇게 열심일까?”이철수는 서울에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만 12세 때인 64년, 미국인과 결혼해 캘리포니아에 살던 어머니와 뒤늦게 합류했다. 그는 한인타운과 차이나타운의 비행 청소년으로 성장해 소년원 등 구금시설과 정신병원을 들락거렸다. 그러다 저 사건에 휘말린 거였다. 이경원은 2010년 일본계 미국인 영자신문 ‘Nichi Bei News’ 칼럼에 자신은 당시 일종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이철수가 겪은 10년의 시련 중 가장 암울했던 첫 5년 동안 그의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 야마다 랜코였다”고 썼다. “한국인 누구도 그의 억눌린 절규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웠다.(…) 랜코와 소수의 아시안계 활동가들(대부분 학생)이 없었다면 캘리포니아 형사사법 시스템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역사적인 운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이경원은 랜코 등의 도움을 받아 수사 및 기소-판결의 여러 허점을 확인했다.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였던 목격자 진술은 아시안계의 얼굴조차 잘 구분하지 못하는 3명의 백인 여행자의 것이었고, 경찰조차 영어에 서툰 이철수를 중국인으로 파악했다. 새크라멘토 유니언지는 미국 서부지역의 유서 깊은 매체 중 하나다. 이경원은 이철수가 석방될 때까지 100여 건의 관련 기사를 썼다. 그의 기사 덕에 랜코를 주축으로 한 소수의 구명운동은 여러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시민이 가세한 ‘이철수 구명위원회’로 거듭났다. 훗날 변호사가 된 랜코는 “이경원은 진실된 기사를 통해 복잡한 사건을 쉽게 이해시킴으로써 이철수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그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했다”고 평했다.당시는 ‘아시안계 미국인’이란 용어가 갓 쓰이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일본계 미국인 커뮤니티센터(JCC, 현 ACC) 창립자 페기 사이카(Peggy Saika)도 이경원의 동지였다. 사이카는 78년 뉴욕으로 이주한 뒤로도 ‘이철수 구명 뉴욕위원회’를 설립해 활동했다. 그 일련의 연대가 아시안-태평양계 미국인 아이덴티티(AAPI) 운동을 낳는 주요 계기가 됐다. 그 전개에서 한인공동체만 부각하는 건 일종의 ‘코리안 워싱(Korean Washing, 민족주의적 세탁)’이다.랜코는 “나는 다만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고, 면밀히 들여다보길 원했다. (… 소외된)우리가 스스로를 조금만 확장하면 엄청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저널리스트 이경원이 말한 ‘애벌레 관점’이 그거였다.
이경원은 일제 치하 경기 개성(현 북한 특별시)에서 독립유공자 아버지 이형순(1884~1949)과 어머니 김순복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작은 제과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1919년 3·1운동에 가담했다가 1년 옥고를 치렀고, 그 바람에 공장이 망해 이경원이 태어나던 무렵엔 행상으로 가족을 건사했다. 이경원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45년 부모 뜻을 거스르고 일본 육군 항공대에 자원 입대했지만, 가미카제 훈련을 받던 중 전쟁이 끝난 덕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고려대에서 영문학(1946~49)을 전공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50년 1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또 한 번 생사의 갈림길을 비껴났다. 그는 웨스트버지니아대(저널리즘 전공, 55년)와 일리노이대 어배너-샴페인(55년 석사)을 졸업한 뒤 ‘짐 크로(Jim Crow)’ 인종 차별 시대의 테네시주 킹스포트 타임스 뉴스(Kingsport Times-News, 1956~58)와 웨스트버지니아의 찰스턴 가제트(Charleston Gazette, 1958~70)를 거쳐 70년 미국 서부지역 유력지 새크라멘토 유니언지(1994년 폐간) 기자가 됐다.
제국 일본 육군항공대 시절의 이경원. 가미카제 훈련 도중 일제가 패망하면서 그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한국전쟁 직전 유학을 떠나면서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했다. 가족사진, wvu.edu
컨트리 가수 존 덴버의 71년 노래 ‘Take me home, country roads’는 "거의 천국인 웨스트버지니아"의 블루리지산과 섀넌도어강이 노천 석탄광 채굴로 망가져가던 현실을 “푸른 물이 낯선 광부의 여인(Miner’s lady, stranger to blue water)” 등의 노랫말로 넌지시 암시한 바 있다. 당시는 18세기부터 이어진 애팔래치아 노천광산 채굴로 산군들의 허리와 정수리가 깎이고 하늘과 강이 석탄 가루로 연중 자욱했다. 더욱이 그 기슭에 깃들였던 가난한 유럽계 이민자와 흑인 광부(가족)들은 1950년대 본격화한 광산 기계화로 인해 더 칙칙해져갔고, 급기야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미 의회의 ‘애팔래치안 지역위원회(ARC)’가 현지 탄광업자 및 그들과 결탁한 관료들의 견제-은폐 속에서 힘겹게 실태 조사를 벌이던 시절이었다. 찰스턴 가제트의 동양인 기자 이경원의 주요 취재 현장이 거기였다. 그는 나흘씩 광부들과 숙식하며 노동인권 실태와 실직자들의 궁핍을 취재해 보도했고, 그 내용을 ARC 파견 요원들과 공유했다. 웨스트버지니아 인권위원회 활동가였던 현지 토박이 캐럴 페렐(Carole Ferrell)은 UCLA의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센터 저널’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애 처음 만난 아시안계 미국인이 당시의 이경원이었다고 말했다. 페렐은 5세 된 아들이 이경원을 보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가면을 썼어?”라고 물은 일화를 소개했다. 한국계 기자 앤절라 오(Angela Oh)는 “그 ‘가면’이야말로 이경원이 평생 벗어던지고자 했던 것”이었다고 썼다. 남부 흑인민권운동서부터 애팔래치아의 가난까지 60년대 미국 저널리즘의 최전선을 누빈 이경원을 찰스턴 가제트는 자사 라디오 광고에서 “관료주의의 감춰진 병폐를 파헤치고, 추적- 추궁하는" 탐사보도 간판기자로 선전했다.웨스트버지니아에서 금권선거 등 선거부정 실태를 기사화한 적이 있던 이경원은 새크라멘토 유니언지로 옮긴 뒤로도 주로 의회 공직자 비리를 전담 취재했다. 70년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판사 등 공무원들과 결탁해 은밀히 ‘은퇴연금법’을 고쳐 자신들의 연금을 부풀린 사건을 특종보도했고, 한 주의원이 부업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관용 전화기로 여행사 업무 관련 장거리 전화를 상습적으로 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요컨대 그는 ‘한국계 기자’가 아니라 ‘기자’였고, 또 그러길 원했다. 그러던 차에 이철수 사건을 접한 거였다. 훗날 그는 이철수 취재를 계기로 비로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애팔레치아 탄광 지대의 가난과 노동인권 실태를 취재하던 1960년대 '찰스턴 가제트' 기자 시절의 이경원. learn.aasc.ucla.edu
79년 신문사에 사표를 낸 그가 동료 둘과 함께 창간한 게 미국 최초 한인 영자 매체 ‘Koreatown Weekly’였다. 미국 한인사회 대표 신문으로 1969년 창간한 ‘미주 LA한국일보’가 있었지만 한국 신문에 일부 현지 기사를 끼워 발행한 교민 대상 한국어 신문이었다. 이경원은 한인의 목소리를 안이 아니라 바깥, 미국 주류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와 동료들은 주간고속도로 ‘I-5’를 타고 새크라멘토 사무실에서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지를 거의 매일 왕복하면서 (사진)취재와 편집을 도맡았고, 그렇게 발행한 주간지를 코리아타운뿐 아니라 아시안계 타운과 미국 주류사회로 실어 날랐다. 자칭 ‘I-5 저널리즘' 실험은 운영난 끝에 82년 막을 내렸고, 이경원은 90년 LA한국일보에 합류해 영문판을 창간하고 초대 편집장을 맡았다.그의 영문 칼럼과 LA한국일보 영문판 기사는 92년 4월 LA폭동에 대한 미국 주류 언론의 천편일률적인 관점- 흑인 커뮤니티에 진출한 한인(상인)과 가난한 흑인 간의 갈등-을 비판하며, 사태의 본질은 흑인에 대한 미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며 한-흑인 갈등은 그 증상의 일부일 뿐이라는 관점을 처음부터 고수하며 주류 매체를 각성시킨 값진 매체였다. 한 사설에 그는 이렇게 썼다. “한국인 이민자에게 이번 폭동은 가난과 범죄로 황폐해진 흑인 지역의 모든 병폐의 희생양으로서 자신들이 유대인을 대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냉정히 상기시키는 사건이다.”폭동 당시 간 이식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그는 병상에서도 기사를 손보고 신문을 편집했다. 그는 LA폭동 관련 일련의 보도로 그해 말 LA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의 ‘존 앤슨 포드 상(John Anson Ford Award)’을 수상했다. 수락 연설에서 그는 자신이 이식받은 새 간이 흑인의 것인지 백인 혹은 아시안의 것인지 무슨 상관이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상호 의존-공존의 끊을 수 없는 인간 사슬 속에 얽혀 있다. 중요한 것은 (피부색이 아니라) 지상에 머무는 한 모두가 서로에게 속한다는 사실이다.”
73년 살인에 대한 원심을 무효 판결한 82년의 재심 재판부는, 하지만 이철수의 10년 옥살이를 77년 옥중 살인에 대한 복역으로 판결했다. 그 탓에 이철수는 83년 3월 아무 보상 없이 풀려났다. 그는 아시아계 교민 사회의 환대를 받으며 강연 등을 다녔지만, 이내 약물 중독과 만성 정신질환으로 힘겹게 살다 2014년 별세했다.이철수 사건은 1989년 할리우드 영화 ‘True Believer’로 다시 주류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주연 배우는 이철수를 변호한 저명 인권변호사 토니 세라(Tony Serra)를 연기한 제임스 우즈(James Woods 분)와 갓 로스쿨을 졸업한 이상주의자 법률보조원 역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Downey Jr.)였다. 마약조직과 결탁한 검찰-경찰이 진범을 감추기 위해 한국계 청년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을 목숨 걸고 밝혀내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는 퇴물 변호사와 이상주의자 청년 법조인의 영웅적 활약상. 영화에는 이경원도, 랜코도 없었다. 일본인 배우(Yuji Okumoto)가 연기한 영화 속 이철수도 철저히 수동적인 조연일 뿐이었다. 그의 개인사 이면에 담긴 미국 이민자들의 현실과 구조적 차별도 말끔히 지워진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전형이었다.2004년 이철수 장례식에 지팡이를 짚고 참석한 70대의 이경원은 추도사를 통해, 잊히고 왜곡된 이철수의 생애를 애통해 했다. 1994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이철수의 운명에서 비껴난 것은 단지 신의 가호 덕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와 나 사이에는 실낱같은 간극밖에 없다. 그에겐 내가 누린 행운이 없었다. 주변에는 엄청난 불운을 힘겹게 버텨내는 이들이 많고, 아시안계 이민자 가운데 특히 많다. 언어가 없고, 그래서 자신들의 사연을 하소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철수 사건을 소재로 한 1989년 영화 'True Believer'의 DVD 재킷과, 줄리아 하의 2023년 다큐멘터리 'FREE CHOL SOO LEE' 포스터. 후자는 2024년 에미상을 수상했다. dvd.fandom.com, pbs.org
고교를 졸업한 1990년 여름, 이경원의 LA한국일보 영문판 편집실에서 인턴 교육을 받은 한인 3세 줄리아 하(Julia Ha)가 그 장례식장에 있었다. 화가 나면 욕설(F-bombs)도 서슴지 않다가도 기쁠 땐 너무 호탕하게 웃다가 의자와 함께 자빠지기도 하면서 젊은 저널리스트들을 가르치던, 이제는 노쇠해진 옛 멘토의 절규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전까지 이철수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줄리아 하는 동료 한인 유진 이(Eugene Yi)와 함께 이철수 사건 기록을 찾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해 89년의 영화가 지우고 왜곡한 사건의 진실과 이민자들을 배반한 미국 사회 시스템의 중층적 맥락을 83분 분량의 2023년 다큐멘터리 ‘FREE CHOL SOO LEE’로 완성했다. 줄리아 하는 생애 첫 작품인 그 다큐멘터리로 2024년 에미상 ‘뉴스& 다큐멘터리’ 부문상을 수상했다. 이경원은 “이제야 이철수도 비로소 진정한 자유(석방)를 얻게 됐을 것”이라며 감격해했다.
이경원은 말년까지 한인-아시안계 이민 사회의 결속과 권리를 위해 헌신하며, 특히 청소년 교육에 힘썼고, 수많은 상과 공로패를 받았다. 그의 오랜 멘티 중 한 명인 LA 인권변호사 도 킴(Do Kim)은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 공동체 교육을 위한 비영리 단체 ‘K.W. Lee 리더십 센터’를 설립했다.이경원은 58년 경찰기자 시절 취재원이던 찰스턴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 페기 플라워스(Peggy Flowers)와 59년 결혼해 3남매를 낳고 해로하다 2011년 사별했다. “늙고 감상적인 바보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페기는 ‘한 망명자(an exile)'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과 새 삶을 선사한, 진정한 나의 미국이었다.” 그가 그 조국의 품으로 떠났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황금성 게임 다운로드동영상황금성모바일파칭코최신릴게임
슬롯머신 무료게임 ≤ 75.rgk574.top ≤ 황금성온라인게임
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 83.rgk574.top ≤ 오락실게임 파라다이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 84.rgk574.top ≤ 릴게임추천
바다이야기예시 ≤ 23.rgk574.top ≤ 바다이야기apk
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슬롯머신 잭팟 종류 체리마스터 다운 우주 전함 야마토 2205 일본야마토게임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강원랜드 슬롯머신 규칙 야마토 창공 바다이야기 온라인 파칭코하는법 슬롯 머신 이기는 방법 실시간릴게임사이트 체리마스터 다운로드 슬롯게임 실시간 온라인슬롯머신 바다게임이야기 카카오바다이야기 무료슬롯 야마토게임공략방법 강원랜드 슬롯 잘 터지는 기계 게임몰릴게임 야마토3동영상 바다이야기코드 백경온라인 야마토 연타 알라딘릴 파친코 카카오바다이야기 바다시즌7 체리마스터 판매 골드몽 먹튀 릴게임횡금성 PC 슬롯 머신 게임 릴게임 추천 사이트 릴게임놀이터 릴게임 다빈치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야마토2다운로드 신천지게임다운로드 야먀토5 메이저 슬롯사이트 슬롯머신 규칙 릴짱 무료카지노게임 릴게임정글북 안전 슬롯사이트 릴게임사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몰릴게임 야마토빠칭코 바다이야기앱 야마토게임방법 릴게임 코리아 꽁머니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 황금성게임공략방법 바다이야기 먹튀 돈 받기 무료 슬롯 머신 카지노 게임 무료 바다이야기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바다이야기 슬롯 몰게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유희왕 황금성 온라인파칭코 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인터넷야마토게임 야마토 창공 황금성게임설명 다빈치무료릴게임 실시간릴게임사이트 온라인 슬롯 머신 게임 pc야마토게임 인터넷오션게임 카카오바다이야기 야마토게임공략 법 무료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알라딘릴게임 바다이야기게임 오션파라다이스게임하는법 체리게임바둑이 강원랜드 잭팟 확률 오리자날 양귀비 다빈치릴게임다운로드 프라그마틱 순위 모바일릴게임접속하기 바다이야기 꽁 머니 환전 바다이야기기프트전환 오션슬롯 인터넷야마토 바다이야기게임기 야마토3 릴게임5만릴게임사이다 야마토5게임기 황금성예시 매장판황금성 야마토게임장 골드몽릴게임 바다이야기꽁머니 PC 릴게임 황금성포커게임 다빈치다운로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모바일 게임 공략 온라인 슬롯 게임 추천 바다이야기2 인터넷야마토 jQuery 슬롯 머신 바둑이넷마블 강원랜드 슬롯머신 하는법 무료 황금성게임 바다이야기 모바일 바다이야기무료체험 뽀빠이놀이터릴게임 우주전함 야마토게임 바다이야기 게임기 바다이야기 게임기 이벤트릴게임 슬롯머신 무료게임 온라인예시게임 릴게임 확률 바다이야기슬롯 슬롯 무료스핀구매 바다이야기 먹튀 신고 검증완료릴게임 가난한 미국 유학생 이경원은 1956년 '짐 크로' 시대의 테네시주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하며 'K. W. LEE'란 바이라인을 썼다. 그는 79년 미국 최초 한인 영자매체를 창간, 이민자 사회 내부가 아닌 주류 사회를 향해 이민자 차별 등 시스템의 불의를 고발했다. 그는 모든 저널리즘은 좌파와 우파가 아닌 매의 관점(조감)과 애벌레의 관점(앙각)으로 나뉜다고 여겼고, 평생 '애벌레 저널리즘'을 고수했다. 70년대 한인 사형수 이철수의 사진을 배경 삼아 포즈를 취한 2022년의 이경원. AP 연합뉴스K.W. Lee(한국명 이경원, 1928.6.1~ 2025.3.8)는 미국 저널리즘 교육 100주년을 기념해 2012년 뉴욕대 아서 L. 카터 저널리즘연구 있 소가 선정한 ‘지난 100년 가장 뛰어난 미국 언론인 100인’에 포함된 유일한 한국계 저널리스트다. 연구소는 그를 “1979년 한국계 최초 영자매체인 ‘Koreatown Weekly’를 창간한 기자 겸 칼럼니스트”라 간략하게 소개했다. 언론인 겸 작가 에릭 뉴턴(Eric Mewton)은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근년까지 미국 저널리즘 역사에 영광과 수치의 족 혜택 적을 남긴 300인을 다룬 책 ‘Crusaders, Scoundrels, Journalists(2000)’에 K.W. 리를,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의 흑인 인권운동가 W.E.B 두보이스(DuBois), 여성 서프라제트 활동가 앨리스 스톤 블랙웰(Alice Stone Blackwell), 초창기 AIDS 보도로 이름을 날린 미국 최초 공개 동성애자 온누리상품권 기자 랜디 쉴츠(Landy Shilis) 등과 나란히 ‘차별 장벽을 허문 언론인’으로 소개했다.K.W. 리의 ‘Koreatown Weekly’ 이전까지 한국계 미국인은 차별과 불의, 소수자의 삶과 존엄을 저널리즘의 언어로 말할 수 없었고, 오직 주류 언론의 관심과 선의에 의지해야 했다. 그에겐 좌파-우파 언론 분류는 한가한 ‘헛소리’일 뿐이었다. “나는 든든학자금대출금리 언론을 새의 관점(bird's eyd)과 애벌레의 관점으로 나눈다. 내가 고수해온 저널리즘은 애벌레 관점(worm’s-eye view)의 저널리즘이다.”기사로 약자-소수자의 정의와 진실을 알리고, 한국계-일본계를 비롯한 아시안 공동체의 결속과 아프리카계 미국인과의 화합에 기여한 언론인 K.W. 리(이하 이경원)가 별세했다. 향년 96세.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소서 이경원은 70년대의 한 사건, 즉 사형수 ‘Chol Su Lee(이하 이철수, 1952~2014)’의 결백을 무려 5년여간 집요하게 보도함으로써 그의 재심-석방을 이끌어낸 저널리스트로 더러 기억된다. 이철수는 1973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 범죄조직 간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기형을 선고 받았고, 수감 중이던 77년 백인 우월주의 단체 조직원을 다툼 끝에 살해해 사형수가 됐다.‘새크라멘토 유니언(The Sacramento Union)’지 기자 이경원은 77년 이철수 사건 취재를 시작해 수사-기소-재판 과정의 부실과 의혹 등을 사실상 처음, 유일하게 집중 보도했다. 그의 보도 덕에 이철수 구명운동이 확산됐고, 이철수는 82년 재심을 받고 이듬해 석방됐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철수 사건'을 한 개인의 구명을 넘어 “미국 거주 한인 동포들을 하나로 단결”하게 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재심 재판을 통해 1983년 석방된 이철수(오른쪽)와 나란히 앉은 이경원. 그는 이철수 사건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았고 이철수가 겪은 삶의 굴곡과 비극이야말로 미국 사회 시스템의 실패의 결과라 여겼다. K.W. Lee Center for Leadership
이경원이 5년이나 지난 이철수 사건 취재를 시작한 건 일본계 미국인 로스쿨 학생 야마다 랜코(Yamada Ranko)의 ‘이철수 구명운동’ 때문이었다. “동포들조차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무명의 한국계 비행 청년을 위해 일본계 미국인 여자아이가 왜 저렇게 열심일까?”이철수는 서울에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만 12세 때인 64년, 미국인과 결혼해 캘리포니아에 살던 어머니와 뒤늦게 합류했다. 그는 한인타운과 차이나타운의 비행 청소년으로 성장해 소년원 등 구금시설과 정신병원을 들락거렸다. 그러다 저 사건에 휘말린 거였다. 이경원은 2010년 일본계 미국인 영자신문 ‘Nichi Bei News’ 칼럼에 자신은 당시 일종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이철수가 겪은 10년의 시련 중 가장 암울했던 첫 5년 동안 그의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 야마다 랜코였다”고 썼다. “한국인 누구도 그의 억눌린 절규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웠다.(…) 랜코와 소수의 아시안계 활동가들(대부분 학생)이 없었다면 캘리포니아 형사사법 시스템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역사적인 운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이경원은 랜코 등의 도움을 받아 수사 및 기소-판결의 여러 허점을 확인했다.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였던 목격자 진술은 아시안계의 얼굴조차 잘 구분하지 못하는 3명의 백인 여행자의 것이었고, 경찰조차 영어에 서툰 이철수를 중국인으로 파악했다. 새크라멘토 유니언지는 미국 서부지역의 유서 깊은 매체 중 하나다. 이경원은 이철수가 석방될 때까지 100여 건의 관련 기사를 썼다. 그의 기사 덕에 랜코를 주축으로 한 소수의 구명운동은 여러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시민이 가세한 ‘이철수 구명위원회’로 거듭났다. 훗날 변호사가 된 랜코는 “이경원은 진실된 기사를 통해 복잡한 사건을 쉽게 이해시킴으로써 이철수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그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했다”고 평했다.당시는 ‘아시안계 미국인’이란 용어가 갓 쓰이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일본계 미국인 커뮤니티센터(JCC, 현 ACC) 창립자 페기 사이카(Peggy Saika)도 이경원의 동지였다. 사이카는 78년 뉴욕으로 이주한 뒤로도 ‘이철수 구명 뉴욕위원회’를 설립해 활동했다. 그 일련의 연대가 아시안-태평양계 미국인 아이덴티티(AAPI) 운동을 낳는 주요 계기가 됐다. 그 전개에서 한인공동체만 부각하는 건 일종의 ‘코리안 워싱(Korean Washing, 민족주의적 세탁)’이다.랜코는 “나는 다만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고, 면밀히 들여다보길 원했다. (… 소외된)우리가 스스로를 조금만 확장하면 엄청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저널리스트 이경원이 말한 ‘애벌레 관점’이 그거였다.
이경원은 일제 치하 경기 개성(현 북한 특별시)에서 독립유공자 아버지 이형순(1884~1949)과 어머니 김순복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작은 제과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1919년 3·1운동에 가담했다가 1년 옥고를 치렀고, 그 바람에 공장이 망해 이경원이 태어나던 무렵엔 행상으로 가족을 건사했다. 이경원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45년 부모 뜻을 거스르고 일본 육군 항공대에 자원 입대했지만, 가미카제 훈련을 받던 중 전쟁이 끝난 덕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고려대에서 영문학(1946~49)을 전공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50년 1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또 한 번 생사의 갈림길을 비껴났다. 그는 웨스트버지니아대(저널리즘 전공, 55년)와 일리노이대 어배너-샴페인(55년 석사)을 졸업한 뒤 ‘짐 크로(Jim Crow)’ 인종 차별 시대의 테네시주 킹스포트 타임스 뉴스(Kingsport Times-News, 1956~58)와 웨스트버지니아의 찰스턴 가제트(Charleston Gazette, 1958~70)를 거쳐 70년 미국 서부지역 유력지 새크라멘토 유니언지(1994년 폐간) 기자가 됐다.
제국 일본 육군항공대 시절의 이경원. 가미카제 훈련 도중 일제가 패망하면서 그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한국전쟁 직전 유학을 떠나면서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했다. 가족사진, wvu.edu
컨트리 가수 존 덴버의 71년 노래 ‘Take me home, country roads’는 "거의 천국인 웨스트버지니아"의 블루리지산과 섀넌도어강이 노천 석탄광 채굴로 망가져가던 현실을 “푸른 물이 낯선 광부의 여인(Miner’s lady, stranger to blue water)” 등의 노랫말로 넌지시 암시한 바 있다. 당시는 18세기부터 이어진 애팔래치아 노천광산 채굴로 산군들의 허리와 정수리가 깎이고 하늘과 강이 석탄 가루로 연중 자욱했다. 더욱이 그 기슭에 깃들였던 가난한 유럽계 이민자와 흑인 광부(가족)들은 1950년대 본격화한 광산 기계화로 인해 더 칙칙해져갔고, 급기야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미 의회의 ‘애팔래치안 지역위원회(ARC)’가 현지 탄광업자 및 그들과 결탁한 관료들의 견제-은폐 속에서 힘겹게 실태 조사를 벌이던 시절이었다. 찰스턴 가제트의 동양인 기자 이경원의 주요 취재 현장이 거기였다. 그는 나흘씩 광부들과 숙식하며 노동인권 실태와 실직자들의 궁핍을 취재해 보도했고, 그 내용을 ARC 파견 요원들과 공유했다. 웨스트버지니아 인권위원회 활동가였던 현지 토박이 캐럴 페렐(Carole Ferrell)은 UCLA의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센터 저널’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애 처음 만난 아시안계 미국인이 당시의 이경원이었다고 말했다. 페렐은 5세 된 아들이 이경원을 보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가면을 썼어?”라고 물은 일화를 소개했다. 한국계 기자 앤절라 오(Angela Oh)는 “그 ‘가면’이야말로 이경원이 평생 벗어던지고자 했던 것”이었다고 썼다. 남부 흑인민권운동서부터 애팔래치아의 가난까지 60년대 미국 저널리즘의 최전선을 누빈 이경원을 찰스턴 가제트는 자사 라디오 광고에서 “관료주의의 감춰진 병폐를 파헤치고, 추적- 추궁하는" 탐사보도 간판기자로 선전했다.웨스트버지니아에서 금권선거 등 선거부정 실태를 기사화한 적이 있던 이경원은 새크라멘토 유니언지로 옮긴 뒤로도 주로 의회 공직자 비리를 전담 취재했다. 70년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판사 등 공무원들과 결탁해 은밀히 ‘은퇴연금법’을 고쳐 자신들의 연금을 부풀린 사건을 특종보도했고, 한 주의원이 부업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관용 전화기로 여행사 업무 관련 장거리 전화를 상습적으로 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요컨대 그는 ‘한국계 기자’가 아니라 ‘기자’였고, 또 그러길 원했다. 그러던 차에 이철수 사건을 접한 거였다. 훗날 그는 이철수 취재를 계기로 비로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애팔레치아 탄광 지대의 가난과 노동인권 실태를 취재하던 1960년대 '찰스턴 가제트' 기자 시절의 이경원. learn.aasc.ucla.edu
79년 신문사에 사표를 낸 그가 동료 둘과 함께 창간한 게 미국 최초 한인 영자 매체 ‘Koreatown Weekly’였다. 미국 한인사회 대표 신문으로 1969년 창간한 ‘미주 LA한국일보’가 있었지만 한국 신문에 일부 현지 기사를 끼워 발행한 교민 대상 한국어 신문이었다. 이경원은 한인의 목소리를 안이 아니라 바깥, 미국 주류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와 동료들은 주간고속도로 ‘I-5’를 타고 새크라멘토 사무실에서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지를 거의 매일 왕복하면서 (사진)취재와 편집을 도맡았고, 그렇게 발행한 주간지를 코리아타운뿐 아니라 아시안계 타운과 미국 주류사회로 실어 날랐다. 자칭 ‘I-5 저널리즘' 실험은 운영난 끝에 82년 막을 내렸고, 이경원은 90년 LA한국일보에 합류해 영문판을 창간하고 초대 편집장을 맡았다.그의 영문 칼럼과 LA한국일보 영문판 기사는 92년 4월 LA폭동에 대한 미국 주류 언론의 천편일률적인 관점- 흑인 커뮤니티에 진출한 한인(상인)과 가난한 흑인 간의 갈등-을 비판하며, 사태의 본질은 흑인에 대한 미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며 한-흑인 갈등은 그 증상의 일부일 뿐이라는 관점을 처음부터 고수하며 주류 매체를 각성시킨 값진 매체였다. 한 사설에 그는 이렇게 썼다. “한국인 이민자에게 이번 폭동은 가난과 범죄로 황폐해진 흑인 지역의 모든 병폐의 희생양으로서 자신들이 유대인을 대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냉정히 상기시키는 사건이다.”폭동 당시 간 이식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그는 병상에서도 기사를 손보고 신문을 편집했다. 그는 LA폭동 관련 일련의 보도로 그해 말 LA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의 ‘존 앤슨 포드 상(John Anson Ford Award)’을 수상했다. 수락 연설에서 그는 자신이 이식받은 새 간이 흑인의 것인지 백인 혹은 아시안의 것인지 무슨 상관이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상호 의존-공존의 끊을 수 없는 인간 사슬 속에 얽혀 있다. 중요한 것은 (피부색이 아니라) 지상에 머무는 한 모두가 서로에게 속한다는 사실이다.”
73년 살인에 대한 원심을 무효 판결한 82년의 재심 재판부는, 하지만 이철수의 10년 옥살이를 77년 옥중 살인에 대한 복역으로 판결했다. 그 탓에 이철수는 83년 3월 아무 보상 없이 풀려났다. 그는 아시아계 교민 사회의 환대를 받으며 강연 등을 다녔지만, 이내 약물 중독과 만성 정신질환으로 힘겹게 살다 2014년 별세했다.이철수 사건은 1989년 할리우드 영화 ‘True Believer’로 다시 주류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주연 배우는 이철수를 변호한 저명 인권변호사 토니 세라(Tony Serra)를 연기한 제임스 우즈(James Woods 분)와 갓 로스쿨을 졸업한 이상주의자 법률보조원 역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Downey Jr.)였다. 마약조직과 결탁한 검찰-경찰이 진범을 감추기 위해 한국계 청년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을 목숨 걸고 밝혀내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는 퇴물 변호사와 이상주의자 청년 법조인의 영웅적 활약상. 영화에는 이경원도, 랜코도 없었다. 일본인 배우(Yuji Okumoto)가 연기한 영화 속 이철수도 철저히 수동적인 조연일 뿐이었다. 그의 개인사 이면에 담긴 미국 이민자들의 현실과 구조적 차별도 말끔히 지워진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전형이었다.2004년 이철수 장례식에 지팡이를 짚고 참석한 70대의 이경원은 추도사를 통해, 잊히고 왜곡된 이철수의 생애를 애통해 했다. 1994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이철수의 운명에서 비껴난 것은 단지 신의 가호 덕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와 나 사이에는 실낱같은 간극밖에 없다. 그에겐 내가 누린 행운이 없었다. 주변에는 엄청난 불운을 힘겹게 버텨내는 이들이 많고, 아시안계 이민자 가운데 특히 많다. 언어가 없고, 그래서 자신들의 사연을 하소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철수 사건을 소재로 한 1989년 영화 'True Believer'의 DVD 재킷과, 줄리아 하의 2023년 다큐멘터리 'FREE CHOL SOO LEE' 포스터. 후자는 2024년 에미상을 수상했다. dvd.fandom.com, pbs.org
고교를 졸업한 1990년 여름, 이경원의 LA한국일보 영문판 편집실에서 인턴 교육을 받은 한인 3세 줄리아 하(Julia Ha)가 그 장례식장에 있었다. 화가 나면 욕설(F-bombs)도 서슴지 않다가도 기쁠 땐 너무 호탕하게 웃다가 의자와 함께 자빠지기도 하면서 젊은 저널리스트들을 가르치던, 이제는 노쇠해진 옛 멘토의 절규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전까지 이철수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줄리아 하는 동료 한인 유진 이(Eugene Yi)와 함께 이철수 사건 기록을 찾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해 89년의 영화가 지우고 왜곡한 사건의 진실과 이민자들을 배반한 미국 사회 시스템의 중층적 맥락을 83분 분량의 2023년 다큐멘터리 ‘FREE CHOL SOO LEE’로 완성했다. 줄리아 하는 생애 첫 작품인 그 다큐멘터리로 2024년 에미상 ‘뉴스& 다큐멘터리’ 부문상을 수상했다. 이경원은 “이제야 이철수도 비로소 진정한 자유(석방)를 얻게 됐을 것”이라며 감격해했다.
이경원은 말년까지 한인-아시안계 이민 사회의 결속과 권리를 위해 헌신하며, 특히 청소년 교육에 힘썼고, 수많은 상과 공로패를 받았다. 그의 오랜 멘티 중 한 명인 LA 인권변호사 도 킴(Do Kim)은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 공동체 교육을 위한 비영리 단체 ‘K.W. Lee 리더십 센터’를 설립했다.이경원은 58년 경찰기자 시절 취재원이던 찰스턴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 페기 플라워스(Peggy Flowers)와 59년 결혼해 3남매를 낳고 해로하다 2011년 사별했다. “늙고 감상적인 바보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페기는 ‘한 망명자(an exile)'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과 새 삶을 선사한, 진정한 나의 미국이었다.” 그가 그 조국의 품으로 떠났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